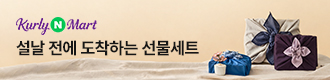지방 변두리지만, 32평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12년정도 걸렸어요,
12년전의 세월을 되돌려보자면 현재 중3인 딸아이가, 처음 살았던 10평남짓한 일층 전세집이었는데
이렇게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어둑신한 저녁이 가까워지는 오후 4시무렵부터 그 집이
생각나요.
머릿속에서 조용히 아주 오래된 기억의 저편 너머에서 마치 영사기가 돌아가듯이
슬며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 스크린이 조금씩 밝아오고,
드디어 어둠이 흠뻑 묻어있는 그 을씨년스러운 집이 떠올라요.
일층이긴 했지만 필로티가 있는 일층이 아니고,
차 두대가 간신히 맞붙을 만큼의 주차공간을 남기고, 그 공간에 겨우 두사람정도만 살면
적당할 듯한 그런 투룸이었어요.
그집은 은근히 무서웠어요.
안방창문을 열면, 바로 눈앞에 5층짜리 빌라가 서있었고
부엌쪽창을 열면, 늘 차들이 서있는 주차장이 보였고
화장실창문은, 늘 옆의 빌라에 사는 사람들 머리가 보였어요.
창문을 닫아도, 비바람불고 컴컴한 밤에는 우리집주변을 앞뒤로 다니는 발자국소리랑
이미 걸쇠를 걸어버린 낡은 안방창문을 흔드는 그림자로 신경이 쓰여서 깊은잠을 못잤어요.
아무리 더운 여름철에도 밤에 그 어떤 창도 열수가 없었어요.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철창을 단 부엌쪽창이 다 열려있고 그 컴컴한 밖에서
어떤 시커먼 남자얼굴이 눈을 크게 부릅뜨고 서있는 장면도 몇번 마주쳤거든요.
너무 놀라서, 소리도 못지르고, 뻣뻣하게 얼어버려서 그저 어,어..
어떤때는,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있는데 그 작은 문이 스르르 열리고, 주인아저씨가 불쑥 얼굴을
들이밀면서 불편한 거 없냐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일층이 그렇게 불편하고 사람들의 눈초리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 것을,
그집을 4년 살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꼭 이렇게 비가 으슬으슬 내리고, 컴컴해지고 인적이 뜸해질 무렵이면
이미 잠금장치해버린 현관문 도어가 덜컥덜컥 밖에서 열리는 소리도 들리고,
누구냐고 물어보면, 혹시 치킨시키셨냐고 한참 지나서 조심스레 물어보아서
실소하게 만들었어요.
애아빠가 지방의 관사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주말에만 오는 사람이어서
더욱더 문단속을 단단히 했었는데, 여름철이면 벽에서 물이 줄줄 흘러대고
바퀴벌레천지에, 머리통이 반질거리는 큰 까만 거미출몰에, 정말 하루도 맘편히
살아본적이 없는 집이었어요.
창문이라도 열면 좀 시원했을 텐데, 이집은 그저 10살정도의 아이들이라도 충분히
부엌창문으로 다 10평정도 되는 집전체를 내다볼정도의 눈높이에 있는 집이라
밤중에 어떤 놈이 훌렁 들어올까 오히려 문을 잘 잠궜는지 확인을 몇차례식 하러
돌아다녔어요.
그 덕택에 그 더운 삼복더위에, 아직 15개월정도인 딸은 걸핏하면 땀을 연신 흘리면서
열이 펄펄 끓었고, 곰팡이 핀 벽도 줄줄 물이 흘러내리고, 선풍기도 더운 바람만 나고.
낮에도 창문을 여는곳마다 액자처럼 사람들 얼굴이 다 걸려있고,
여자든 남자든, 볼것도 없는 남의 가난한 사생활을 궁금해하는 타인들 눈초리에
진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사년을 살다가, 드디어 짓고있다는 신축빌라 3층 12평에 전세로 들어갈때
그 감동은 말로 못햇죠.
뒷산초입에 있는 빌라여서 그 3층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은 완전 천국이었어요.
활짝 열어둔 창문으로 하얀 반달이 뜨고 별이 총총하고 바람이 파도처럼 키를 높이면서
밀려들어오는데, 그처럼 홀가분한 기분 , 지금의 32평 아파트를 마련했던 때보다 더 넓고 컸어요.
아마 차가운 바람결이 내 콧등을 간지럽히고 급기야는 내 몸을 다 휘감고, 온 방안을 다 껴안은채
양탄자처럼 날아가려는 듯한 그 느낌, 지금도 생생해요.
그런데
그 홀가분한 기분도 얼마 못가서,
저는 계단을 쿵쿵 올라와서 우리집 문앞에 멈춰서서 벨을 누르는 사람들에게 시달렸어요.
그 사람들이 전에 그 낡고 우중충한 빌라에 살때 자주 창문에 얼씬대다가 제 인기척이 있으면
매일 아무때나 오던 사람들이었어요.
아침열시에도 오고, 아무때나 오고 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집요하게 창문밖에서 우리집을 궁금해하고 제가 빨래를 개키거나 텔레비젼을 보는 모양새를
재미있는 눈요깃감처럼 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지겹고 싫었어요.
그런 기분들, 너무 소름끼치고, 그 눈빛들이 너무 싫었어요.
밤에도 창문을 들썩거리면서 긴 그림자가 너울거려지던 그 깊은밤의 창문들.
날이 새면 그런적 없다는듯 주변은 조용하고,
밤만되면 특히나 비오고 적적한 그런 밤이면, 완전 집밖을 도는 발자국소리로 시끄러웠던 그집.
아무일 없이 나오길 잘했는데,
그집에서 4년을 살다보니, 기관지가 많이 안좋아져서 지금도 많이 고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