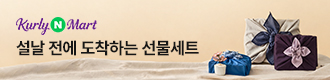적어도 비아냥 댓글은 없어서 이어서 씁니다.
이게 처음 쓴거고요.
이어서요.
그리고 우리애 유치원 맘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립초에 원서를 넣었어요.
그렇다고 영훈초 이런데 급은 절대 아니었고요.
노도강 맘들에게 그래도 당시 가장 인기 있었곳 이에요.
그리고 또 탈락.
결국 집 근처 공립초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본격적으로 제 시험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한마디로 제 삶이 전쟁터였죠. 아침에는 큰애 등교시켜 보내고 작은애 어린이집 보내고 그다음 저는 집안 살림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집에서 공부시작.
그리고 큰 애가 학교 끝날 때 또 가서 데려오고 그 당시에 같은 반 엄마들끼리 뭉쳐 다니고 그랬는데 저는 거기 끼지도 못 했죠.
그렇게 큰애 숙제 봐주고 내 공부하다가 작은애 어린이집 데리고 와서 또 저녁 밥 먹이고 설거지도 하는 둥 마는 둥 애들 억지로 재워놓고 또 공부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새벽에 나갔다가 밤 12시 다되어 들어오니 집안은 엉망이니까 보다 못한 남편이 설거지도 해놓기도 하고 참 많이 싸웠어요.
그렇게 큰아이 1 학년 가을쯤 되었을 때 아이 둘 데리고 소아과를 가게 되었어요.
진료후 약국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마침 약국에 5~6학년 쫌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사립초 체육복을 입고 엄마랑 같이 약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지원했던 사립초보다는 인기가 덜한 곳이긴 한데 그래서인지 편입 자리가 잘 나온다고 들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혹시
이 사립초 편입시킬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학교는 어떠냐고 그 애 엄마한테 웃으면서 공손하게 물었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말을 안 하는 거에요. 그러더니 나를 위아래로 쭉 훑어보고 우리 애들도 위아래로 쭉 훑어봐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대요.
그리고 '뭐 좋죠' 이러고 끝이에요.
근데 그때 내모습이 정말 초췌. 옷은 다 늘어진 티셔츠에 무릎 나온 추리닝. 거기에 책들이 잔뜩 들어간 허름한 배낭. 운동화. 머리는 대충 뒤로 질끈 묶고. 두꺼운 안경에. 스킨로숀 하나 안 바르고요.
큰앤 그래도 신경 써서 입혔지만 작은애는 뭐 내 차림 못지 않았죠.
내가 옷차림같은 외형에 신경 쓸 시간이 있으면 책 한번을 더 보죠. 그때 내 시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근데 그때 기분이 진짜 이상하더라구요.
단순히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너무 이상한거에요.
나와 애들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느낌?
그리고 서울교대부속초에서의 그 짧은 경험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여기서 이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어디로? 강남 8학군으로!!
서울교대부속초에서의 그 짧은 경험이 너무 컸던거에요.
<이번에도 댓글에 적어도 비아냥이 없으면 나머지 세 번째 또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