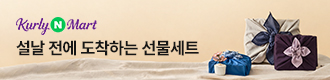약까지 먹으면서 마드리드를 돌아다닌다니 무슨 일인가 싶은데 첨에는 건강하게 잘 다녔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원래도 열이 많은데 마드리드 와서 덥다고 밤에 에어컨을 너무 낮게 해놓고
자는 바람에 본인은 편도선에 감기들고 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하루 쉬라고 두고 혼자 돌아 다녔는데 그냥 두려니 좀 안됐길래
목 아픈 사람이 먹을만한 빵하고 좋아하는 음료나 사다놓고 나가야지 싶어서 밖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날이
가게가 거의 다 문을 닫아서 할 수 없이 멀리 갈 수 밖에 없었는데 여길 다녀 오면서 일차로 힘이 들었는데 그땐 몰랐죠.
구글 지도에 목적지까지 얼마 걸린다 이러면 한국에서는 보통 전 걸음이 빨라서 그거 보단 안 걸리기에 그거 믿고
갔더니 여기 사람들 속도가 훨씬 빠른 건지 시간이 더 걸리는데다 오전은 바람도 불고 시원한데 대충
10시 넘으면 여긴 따가운 햇살이 사정없이 내려 퍼붓기 시작하거든요.
그 더위를 느끼면서 음료랑 물건들고 햇빛을 머리에 이고 갔다 온 후에 혼자 여러 곳을 돌아 다녔는데 그 중에 한 곳은 김건희가 최근에 어떤 이유에선지 갔다는 마드리드 한인상점도 있었죠.
홈피를 봐도 문여는 날이 안 나와 있어서 그냥 갔더니 문을 안 열었던데 허탕친 거기 갈 때도 전철에서 내려서 걸어 가면서
완전 한 낮이었고
그 앞에는 마드리드에서 꼭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로 벼룩 시장이 나와 있길래 그게 일요일날 하는 거니까 가볼까 했는데 시간이 거의 끝 날 거 같은 시간인 거에요.
그래도 일찍 짐싸는 사람, 늦게까지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 하니까 가보자 싶어서 갔더니
차로 가는 거나 걷는 거나 같길래 걸었더니 그게 바로 저의 패착이었어요.
역시 구글에 나와 있는 걸리는 시간은 현지인용인건지 시간보다 더 걸리고
저는 또 조금이라도 빨리 가겠다고 그 한 낮에 짐들고 거길 걸어가면서 물론 항상 그늘은 있으니까
그늘로 그늘로만 갔지만 그것도 한 낮에 25분을 걸은게 그늘이라도 몸에 무리가 가는 대단히 힘든 일이었던가봐요.
실컷 갔는데 정말 모두 일시에 짐싸고 있던 상황이라 실망하고 다시 전철을 타려니
오르막을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라 오르막을 걸었는데 그때는 스스로 좀 힘들다 느꼈지만 어쩌겠어요. 또 걸어 올라갔죠.
올 때는 남편 약 사면서 그 옆에 ALDI가 있길래 거기 가서 또 좋아하는 음료를 두 개나 사고 그게 액체라 무게가 상당한데
완전히 무거워진 상태로 집에 왔더니 더위에 사람이 완전히 소진되었나봐요.
오후 4시 지나서 내리 꽂히는 햇살도 정말 반바지 맨살에 닿으면 살이 따가울 정도거든요.
길바닥에 날계란 올리면 아마 완숙이 될 정도인데 이런 날씨에 현지인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안 쏘다닐텐데 저는 현지에
맞추지 않고 종횡무진 하다가
그날 이후로 저도 완전 몸살이 나서 너무 너무 힘든 거에요.
왜 시에스타가 있는지를 실감하겠더라구요.
여기서 계속 살아온 사람들은 그 시간에 나돌아 다니면서 그 햇살을 다 받으면 사람이 기력이 소진, 고갈돼서 살 수가 없는 걸 안 거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왔을 때는 톨레도에서 돌아다니면서 더워서 애얼굴도 복숭아 아니 빨간 사과 같이 달아오른 거 보고 우리도
사실은 아니겠지만 마치 우리를 기다린양 반갑더라구요.
요번엔 그렇게 더운 건 아니네 싶었는데 그 때는 마드리드는 그렇게까지 죽을 맛은 아니었거든요.
동선을 한 낮 시간은 실내에 들어가 있는 걸로 짜야 하는데 그때는 첨이라 그저 발길 되는대로
우리 계획대로 간 거라면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는데도 일요일은 제가 이리 저리 돌아 다녔지 실내에 있지 않아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 날 이후로 몸살 때문에 평소라면
집에서 쉴텐데 쉬지도 못하고 돈버는 것도 아니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갑니다.
프라도를 가긴 갔는데 좋긴 하지만 살살 할머니 모드로 다니다 보니 하루 종일 거기 있다가 사람 많아지는 free admission
타임으로 사람들 들어올 때쯤 나왔어요.
세계 몇 대 미술관이라지만 현대쪽은 아주 약하구요 스페인 국민화가 고야 좋아하시는 분이 가면 좋은 거 많고 양도 무지 많아요. 그리고 루벤스 작품도 많고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여류화가 젠틸레스키 작품도 많아요.
그런데 오디오 가이드는 한국어가 있디는 한데 귀에다 대고 들어야 해서 그닥 좋지는 않아요.
저는 짐무게 때문에 안 샀는데 차라리 메인 프라도 shop에서 한국어로 된 프라도 미술관 작품해설책을 사서
들고 다니면서 보는 게 더 나을 듯 해요. 두껍고 충실하고
19,? 유로 였던 것 같은데 미술책이 의례 그렇듯 무거워요.
나는 그닥 미술 애호가는 아니다 이러신다면 굳이 세계 몇 대 미술관 이런 타이틀, 우리 나라 사람들이 좀
이런 타이틀에 약한 경향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뭐 굳이 그닥 프라도에서 꼭 봐야 할 게 있는 게 아니라면
프라도보단 티센-보르네미사 미술관을 추천해요.
여긴 13세기부터 현대미술 예를 들어 리히텐슈타인의 woman in Bath까지 다 있습니다.
티센가가 독일인이라 독일 작가 작품이 많은 건 있지만 그래도 한 자리에미술 사조 전체를 이울러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도 월요일 12에서 4시까지는 무료에요.
티센이 스페인에 작품을 넘길 때 조건 중 하나가 사람들이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시해 줄 것이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지 프라도나 소피아 왕비 museo는 free admission이 딱 2시간인데 반해서
여긴 4시간이라 충분히 여유롭게 볼 수 있고 월요일로 정한 날짜를 안 바꾸고 하더라구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여기 오디오 가이드기는 분명
한국어 서비스인데 간간이 일본어가 나와요.
코로나때문에 전세계 여행이 거의 끊어지다보니 책자도 수정이 안돼서 그런가 책자에 나온 맛집이라고 되어 있어서 찾아 갔다가 문 닫은 곳을 여러 번 경험 했구요
아마도 이것도 코로나로 인한 수입감소를 못 버틴 건지 뭔지 하여튼 그랬는데
관광지도 무료 입장이라고 되어 있는 곳들이 저런 키센가 정도에서 하는 거 아니면 하루쯤 하긴 해야 하니까 하긴 하는데
그냥 시시때때로 바꾸는건지 하여튼 안 맞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체로 톨레도는 일요일 무료로 되어 있던데 주말에 톨레도 가고 월요일 티센 가고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전철 타고 다니면서 눈에 띈 거 두 가지는 일단 일상에서는 코로나가 끝난 듯이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저 상의는 브라쟈만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아무도 쳐다 보지 않고
실제 그런 사람들 많았고 아니면 그냥 런닝 같은 가슴 부분이 많이 많이 파진 런닝 같은 거 그거 하나 걸치고
하의는 엉덩이 양쪽 곡선이 보이다 못해 구멍만 가린
바지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많이도 입고 다니고요
레깅스 그야말로 레깅스니까 얼마나 붙어요.
그런데 거기다 브라질 왁싱도 했나봐요. 그래서 내 앞으로 걸어오는 여자의 그게 너무도 적나라한테도 다들
그러고 다니더군요.
여자들이 한국과 달리 엉덩이 한쪽이 우리 나라 여자들
두쪽 크기로 큰데도 그렇게 입고 다니더라구요.
여기도 남자들도 본능이 있겠지만 저렇게 늘 보면 그냥 저런게 눈에 보이지 않겠다 싶을 정도로 시선XX
이런 류는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중국어 시끄럽다 한 거 여기와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게 스페인 사람들 무지
시끄럽게 말하고 그게 강세가 있어서 그런건지 그리고 말하길 좋아하는지 전철에서도 길가면서도 핸드폰 붙들고 뭐라 뭐라
소리 지르면서 가는 사람들 많이 봤구요
더 심한 건 스페린어 1도 모르는 제가 물어도1절부터 4절까지 시종일관 스페인어로 설명해주고 끝내요.
영어 무지 안되구요 그래도 학교에서 영어 배울텐데 어떤 레스토랑에서는 저희가 와인 달라고 했더니
그 와인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결국 여 주인이 달려왔어요.
식사 메뉴판 보여줬고 그거 보면서 와인 이라 한 건데 그것도 못 알아 듣는 것도 신기 하고
아니 신기하다 못해 계속 되니까 갑갑하고 정말 영어가 너무 안 통해요.
그럼 뭐 니가 스페인어 배워서 가지 그랫냐 하시겠지만 아 저야 한국 사람으로 못하는 영어 하는 것만 해도 힘들죠.
적어도 우리는 상대가 못 알아 들으면 다른 방법을 취하지
그렇게 끝까지 자기 말로 다하고 끝내 버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너무 외국인 생각을 해주고 사는 건지, 그래서 역으로 제가 외국가서 그런 대접 받으면 저도
눌러 살아도 볼까 생각도 해보겠다 싶을 정도로 친절하단 생각이 들 거 같아요.
다행히 요즘은 구글 번역기가 있어서 저도 약 살 때는 그냥
번역기 돌려서 약 샀거든요.
그거야 내가 돈 쓰는 입장이고 명확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길에서 뭔가 상호작용 할 때는 상대를 세워놓고 그렇게 구글 번역기에다 글쓰고 있을 수 없으니 간단하게라도
영어가 되야 하는데 심지어 프라도 같은 그런 곳 조차 영어 1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사용인구로 따지면 중국어 다음으로 스페인어 사용인구수가 많다 하고 중심가 가서 보니까 스페인어 쓰는 나라 국민들은 다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긴 했는데 스페인어 사용자는 많은데 문제는 그 나라들은 돈이 없는 거라네요. ㅋ
어쨌든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은 다 스페인어를 하는 것만 봐온 건지 그래서 나도 당연 스페인어 하리라 생각한건지 참 나도 스페인어를 이 참에 배워야 하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대학 때 교양으로 배운 건 다 이미 안드로메다로 가버려서 지금은 기억도 안나고 딱 한 번 버스 기사 아저씨가 나보고 세뇨라 하던 것만 들으면서 음 내가 배웠던 단어였는데 싶었어요.
또 한 가지는 덥다 덥다 하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온 때문인지 낮에 더운데도 보면 항상 가게 안이 아닌 바깥 노천 카페에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구요.
어느 날은 완전 수영복 차림으로 물총데이라고
그 더운데 다 큰 사람들이 경찰한테도 물총 쏘고 다니고
청소하는 아저씨는 위아래 긴옷 입고 청소하고 있고...
물론 그늘은 만들어져 있지만 그래도 더운 건 더운 건데
좀 비싼 레스토랑은 뭐 수증기를 뿜어주긴 합디다만 그 대신 음식값에 그것 값도 첨가 ㅋㅋ
바르세로나에서 해변에서 정식으로 먹었는데 뭐 전채부터 일차, 이차, 후식, 마실 것까지
나오구선 밖에 앉았다고 그 자리값을 음식값의 10% 더 받는 상술이 있더군요.
그런데 뭘 그리 많이 먹는지 그렇게 먹으니 식사 시간이 2시간이 되겠다 싶기도 했어요.
그리고 올리브의 나라답게 음식들이 기름져요.생선 대구구이 나오는데 그것도 그냥 올리브유를 밑에 쫙깔고 나오질 않나
크로와쌍을 사면 종이봉투가 정말 기름 칠갑으로 금방 바뀌어요.
그 외엔 어느 도시를 가든 항상 사람들이 애들 데리고 다니니까 울음 소리, 징징 대는 소리, 야단 치는 소리가 들려서
내가 서울에서는 별로 못 듣던 소리다 싶었던 인상적이었어요.
좋았던 점으로 확실한 건 빵값 싼 거, 택시비 싼 거도 있지만 그보다 과일이 값도 싸고 너무 맛있네요.
체리 엄청 싸구요 특히 납작복숭아 이건 저희가 그저 매일 일일 일 납작복숭아일만큼 너무 맛있고 어느 가게에서 사든
배신이 없을 만큼 맛있어요.
아마 해가 강해서 과일도 당도가 높으면서 땅이 넓어서 싼건가 싶기도 하고 뭐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매일 체리와
납작복숭아와 함께 하는 식이 되버렸어요.
버스가 목적지 그라나다 다 온 거 같아서 접어야 겠어요.
다시 읽어 보고 수정할 시간도 없는데 대충 여행기에요.